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등과 함께 21세기 후반의 전 지구 강수량변화에 대한 기후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는 성과를 거둬냈다.
이번 연구는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량에 대한 기후변화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해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67개의 기후모델에 의한 기온과 강수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거의 관측 자료와 비교했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미래에 어느 정도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은 보통 복수의 기후모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기후모델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한다.
온도 상승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성공적으로 수행돼왔으나 강수량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강수량변화 예측의 불확실성 개선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로서 과거의 강수량변화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인 에어로졸이 함께 작용했음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두 요인이 함께 증가했으나 미래에는 적극적인 대기오염 대책에 의한 에어로졸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의 증가만이 지배적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강수량변화는 주로 온실가스 농도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메커니즘과 달라 관측 자료에서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세계평균 에어로졸 배출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기간(1980~2014년) 동안 모델과 관측의 트렌드를 비교함으로써 온실가스 농도증가에 대한 기후 응답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중간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있어서, 67개의 기후모델이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후반에 강수량이 1.9~6.2%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각 기후모델의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 응답 신뢰성을 고려함으로써 강수량증가의 예측 폭의 상한(6.2%)을 5.2~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예측의 분산 또한 8-30% 줄이는 것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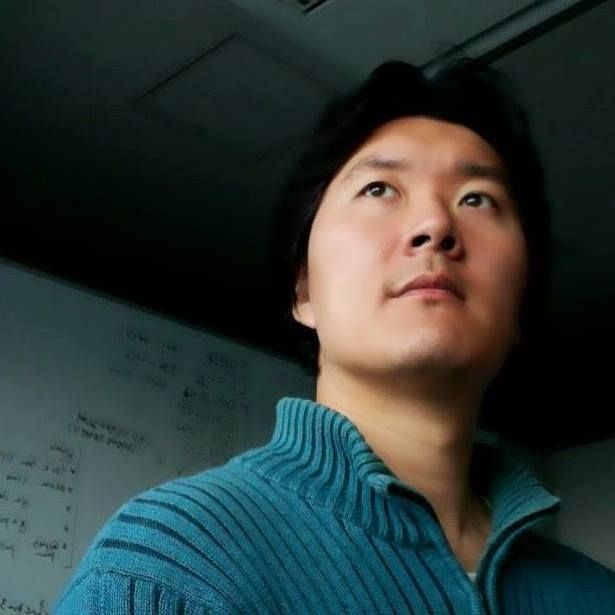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지 2월 23일자에 게재됐다.
[ⓒ 케이아이이뉴스-(구)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