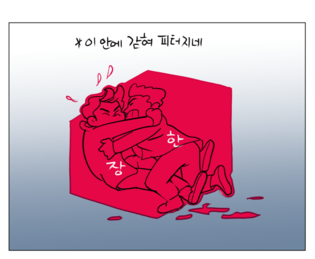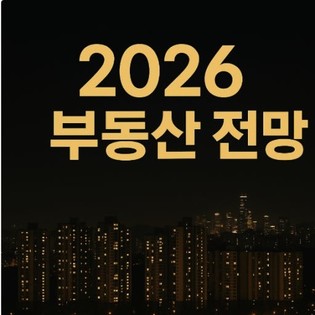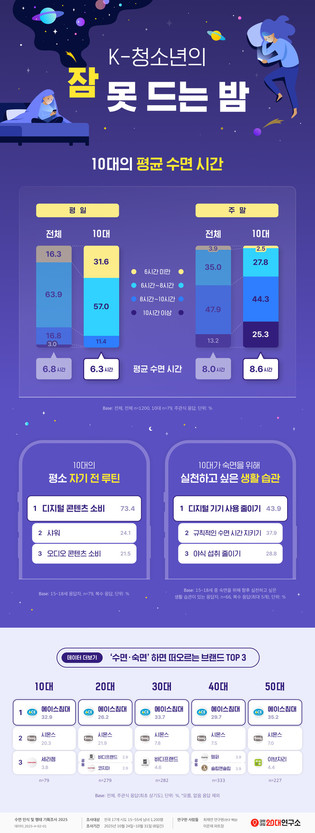[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영국 뉴캐슬의 W.B Wilkinson이라는 사람이 1854년에 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에 관한 특허를 얻게 되었다.
그는 거푸집으로 움푹한 석고 돔모양 틀을 사용하였다.
거푸집사이 돌기의 중심부에 광산에서 쓰다버린 도르래 쇠줄을 넣고 나서 돌기를 콘크리트로 채웠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이름이 철로 보강한 콘크리트(iron-reinforced concrete)이다.
그 후에 철 대신에 구조용으로 적합한 강철(steel)로 보강되어 강철보강 콘크리트(steel reonforced concrete)로 되었다.
대륙의 프랑스에서는 Lambot가 1848년에 강선을 넣은 콘크리트 배를 만들어서 1855년도에 특허를 내었다.
그의 특허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도면과 4개의 원형 철봉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기둥의 도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1861년에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인 Coignet가 철근콘크리트의 사용법을 설명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시기는 재료역학과 구조역학의 체계가 거의 완성된 시기이다.
철근콘크리트의 과학적 지식의 초기 발전에 가장 큰 자극제는 아마도 Joseph Monier의 공적일 것이다.
1850년경 그는 나무를 심기위해 주철로 보강한 콘크리트 화분으로 실험을 하였다.
1867년에 그는 자기 아이디어를 특허 냈다.
이 특허는 그 다음에 이어서 철근콘크리트 파이프와 수조(1868년), 플랫 슬래브(1869년), 교량(1873년), 그리고 계단(1875년) 특허 내는데도 계속되었다.
1880년부터 1881년에, Monier는 같은 종류에 대한 많은 독일 특허를 얻어 내었다.
이 특허는 시공사인 Wayss & Freitag에게 허가를 내주고 이 회사는 Stuttgart 대학교의 M rsch교수와 Bach 교수에게 철근콘크리트(Eisen-armier Beton)의 강도를 시험하도록 의뢰하였고, Prussia의 건설 주감독인 Koenen에게는 철근콘크리트의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의뢰하였다.
1886년에 발간된 Koenen의 책에서는 중립축이 부재의 중간높이에 있다고 가정한 해석방법이 실려 있었다.

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1875년에 Long Island에 기계 기술자인 W.E Ward가 세운 집이었다.
1890년에 Frencisco에 Leland stanford jr. 박물관을 세웠다.
이 2층 건물에는 보의 보강재로써 케이블카 강선이 사용되었고 1903년에 Pennsy vania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완전히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이 세워졌다.
1875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동안에, 철근콘크리트에 관한 과학지식은 일련의 특허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1904년에 발간된 영국의 과학지에서는 15개, 독일에서는 14개, 미국에서는 8개, 영국에서는 3개 그밖에 지역에서 3개등 모두 43개의 특허가 소개되었다.
이들의 철근의 모양에서 차이가 있고, 철근을 절곡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1890년에서 1920년에 이르기까지 서적,기술 기사 및 시방서등이 이론을 제공하자 실무 기술자들은 서서히 철근콘크리트의 역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1894년에 프랑스 토목학회에 발표된 논문에서 Coignet 와 de Tedeskko는 Koenen의 이론을 확장하여 휨에 대한 허용응력설계법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은 1900년부터 1950년에 이르기 까지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영국의 Steel reinforced concrete는 당연히 보강재가 강철인 것으로 생각하여 Steel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reinforced concrete로 불리게 되었으며, 대륙의 독일에서는 armiertete라는 단어로 생략하여 Stahlbeton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으로 수입되어 철근콘크리트 말이 생겨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철근콘크리트의 거동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설계법을 낳게 되었다.
한편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한 재료이므로 균열이 쉽게 생긴다.
철근으로 보강해도 균열은 하중이외의 여러 요인으로 콘크리트에 생기게 된다.
대부분의 균열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철근이 보강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리카락보다 굵은 균열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콘크리트 내구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는 노력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이다.
인장이 생길 곳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서 나중에 발생되는 인장응력과 미리 준 콘크리트 압축응력이 상쇄되어 콘크리트에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초기의 콘크리트 기술자들에게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 생각을 실현시켜 성공한 사람은 프랑스의 E.Freysinnet이다.
1928년에는 보통의 철근으로 프리스트레스에 힘을 주는 경우에 콘크리트 크리잎이 프리스트레스 힘의 대부분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싱에는 고강도 강선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Freysinnet는 긴장재 정착구를 개발하였고 몇 개의 선도적인 교량과 구조물을 설계하고 시공하였다.
그가 죽기전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보통의 철근콘크리트와는 달리 전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고집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깨뜨린 사람은 영국의 P.Abeles 이다.
그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Freysinnet가 고집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완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정의하고 보통의 철근콘크리트는 프리스트레스가 없는 콘크리트로 생각하여 그 중간정도의 프리스트레스를 준 콘크리트를 부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정의하였다.
부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철근 콘크리트가 도입된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개척할 때부터다.
경인철도 공사와 더불어 근대의 토목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일본의 대륙진출 전진기지로서 이용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에 교량, 항만 접안시설등에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아직도 국도의 교량일부에는 이 시기에 지어진 콘크리트 교량이 남아있다.
6.25동란으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었고 휴전 후 복구공사에 콘크리트는 크게 기여하였다. 1961년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콘크리트 공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산업화 그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하여 주거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의 수요의 증가로 콘크리트 공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질적인 면에서 오래전부터 토목공사를 천하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해온 잘못된 공사 관습 때문에 곳곳에서 부실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안조영 기자
[ⓒ 케이아이이뉴스-(구)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