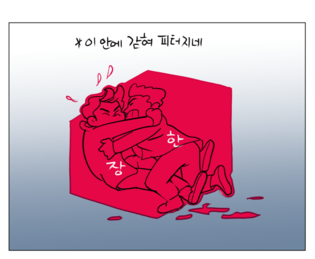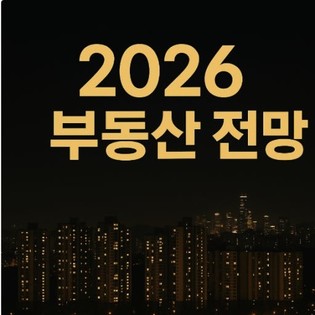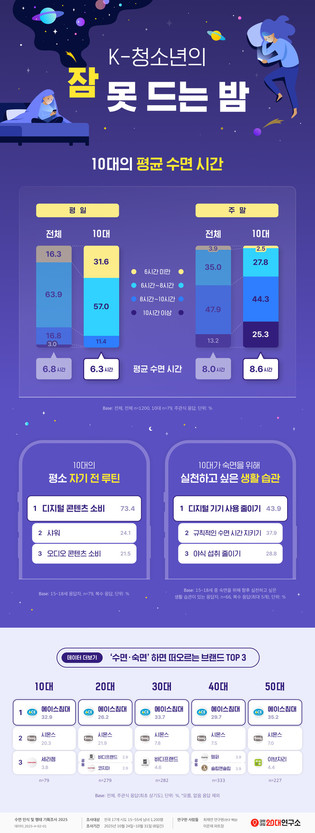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일수는 1월이 3.6일로 가장 많았고 2월 3.1일, 3월 2.8일, 4월 2.2일의 순이었다.
실효습도는 1주일 내지 10일 전부터의 습도의 경과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서 산출한다.
목재 등의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로 주로 사용된다.
공기가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쉽지만 똑같이 습도가 낮더라도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된 경우와 일시적으로 습도가 내려간 경우의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차이가 많다.
실효습도는 공기의 습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보통 쓰이고 있는 상대습도나 절대습도와 달리, 건조의 시간 경과까지 계산해서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실효습도가 60% 이하이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50% 이하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다.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25% 이하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다.
35% 이하면 쉽게 불이 날 수 있고 실제 최근 10년간 일어난 산불 중 59%는 실효습도가 낮은 봄철에 발생했다.
대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과 그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 비율인 상대습도도 봄철 기간에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는 66.4%, 1990년대 63.0%, 2000년대 60.3%, 2010년대 60.6%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연 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단위의 한해 상대습도도 1980년대 71.3%에서 1990년대 68.4%, 2000년대 66.4%, 2010년대 67.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 케이아이이뉴스-(구)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